
(일러스트=야구공작소 황규호)
[야구공작소 오상진] 메이저리그 자유 계약(FA)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번 스토브리그는 지갑을 닫은 구단들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흘러갔다. 대형 계약의 척도라 할 수 있는 ‘1억 달러’ 이상 계약 소식은 2월 11일(한국시간)이 돼서야 들려왔다. 다르빗슈 유(시카고 컵스, 6년 1억 2600만 달러)의 계약을 시작으로 에릭 호스머(샌디에이고 파드리스, 8년 1억 4400만 달러), J.D. 마르티네즈(보스턴 레드삭스, 5년 1억 1000만 달러)가 새로운 둥지를 찾았다. FA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던 세 선수는 당초 예상 금액에는 못 미쳤지만 ‘억’소리 나는 대형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최근 10시즌 1억 달러 이상 FA 계약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스토브리그 제외
2001년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총액 2억 달러(텍사스 레인저스, 10년 2억 5200만 달러 계약)의 벽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1억 달러의 사나이’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FA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지난 10번의 스토브리그에서 총액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선수는 26명에 불과했다. 한 번의 스토브리그에서 평균 3명 미만의 소수에게만 1억 달러 고지를 밟는 것이 허용됐다.
시장의 규모가 커진 요즘도 1억 달러 FA 계약은 넘기 어려운 벽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무려 20년 전에 성공한 선수가 있다. 메이저리그 최초로 1억 달러의 벽을 허문 ‘싱커의 마술사’ 케빈 브라운이다.
메이저리그 최초 1억 달러의 선수
‘최초’라는 단어와 인연이 깊은 LA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FA 계약 역사에서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1998년 12월 12일(현지시간) 케빈 브라운과 7년 1억 500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은 것이다. 두 시즌 연속 가을 야구 탈락의 고배를 마신 다저스가 에이스 영입을 위해 지갑을 연 결과였다. 이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은 불과 2달 전 뉴욕 메츠가 마이크 피아자와 맺은 7년 9100만 달러의 계약이었다.
당시 브라운은 1996년 17승을 시작으로 3년 연속 15승 이상을 기록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었다. 그는 1997년 플로리다 말린스의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였고 이듬해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2년 연속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은 ‘우승 청부사’ 브라운은 다저스와의 계약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에 ‘최초’라는 발자취까지 남길 수 있었다.
최고액 계약은 최악의 계약으로
만 34세 시즌을 맞는 선수와 역대 최고 금액으로 7년 장기계약을 맺은 다저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다저스가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1994년 메이저리그가 6개 지구로 개편된 이후 다저스는 몇 년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명실상부한 강자였다(1994-1995년 1위, 1996-1997년 2위). 하지만 1998년에는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밀려 지구 3위까지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직전 해10승 이상을 거둔 투수가 무려 5명(노모 히데오•박찬호 14승, 이스마엘 발데스•라몬 마르티네스•톰 캔디오티 10승)이나 되었던 선발진은 부상, 부진 등이 겹쳐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
다저스는 20대 중반의 젊은 투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선발진에 베테랑 에이스를 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다저스의 첫 번째 타깃은 휴스턴 애스트로스 이적 후 완벽하게 부활(10승 1패 평균자책점 1.28)한 랜디 존슨이었다. 하지만 존슨은 피닉스에 있는 가족을 위해 고향팀 애리조나와 계약을 맺었다(4년 5200만 달러). 존슨을 놓친 다저스는 마음이 급해졌고 결국 애리조나와 존슨의 계약 이틀 뒤 브라운의 영입을 발표했다. 당시 브라운의 나이는 만 33세(1965년 3월 14일생)로 만 34세였던 존슨(1963년 9월 10일생)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브라운은 지구 최하위 팀이었던 샌디에이고를 단숨에 지구 1위에 올려놨고 14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이끌어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다. 존슨의 영입 실패와 지구 라이벌 애리조나의 전력 강화, 브라운의 가치 폭등까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다저스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큰 지출을 해야만 했다.
‘대박 계약’의 주인공이 된 브라운은 FA 계약 첫 해인 1999년 18승을 거두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했다. 2000년 역시 13승으로 승수는 적었지만 2점대 평균자책점(2.58)을 기록,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박찬호와 원투펀치를 이뤘다. 하지만 브라운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다저스의 팀 성적은 여전히 지구 2-3위권을 맴돌았고 이어지는 2001년과 2002년에는 그마저 부상으로 각각 20경기, 17경기 출전에 그치며 제 몸값을 하지 못했다.
2003년에는 다시 14승 9패, 평균자책점 2.39로 부활에 성공했지만 다저스가 브라운을 안고 가기에는 나이(만 38세)와 부상이라는 위험부담이 너무 컸다. 브라운은 시즌 종료 후 트레이드를 통해 뉴욕 양키스로 팀을 옮겨야 했다. 2004년 전반기 7승 1패를 기록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했지만 결국 또 부상에 발목이 잡혔고 2005년 역시 부상과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쓸쓸히 유니폼을 벗었다.
‘최초’였지만 ‘최고’는 아니었던
 <케빈 브라운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
<케빈 브라운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
브라운은 1억 달러의 벽을 허문 최초의 선수였지만 ‘최고’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뛴 19시즌 동안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 상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사이영 상에 가장 근접했던 1996년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1.89)을 기록했고 17승(내셔널리그 3위)이나 거뒀지만 존 스몰츠(24승 8패 평균자책점 2.94)에게 밀려 2위에 그쳤다.
그의 커리어는 사이영 상이 아닌 다른 부분을 살펴봐도 타이틀과 조금은 거리가 있었다. 평균자책점 1위는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기록했고 다승 1위는 유일하게 20승 고지를 밟았던 1992년 한 차례뿐이었다. 싱커가 주무기였던 그는 4년 연속(1997-2000) 탈삼진 200개 이상을 기록했지만 타이틀은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다(최고 기록 2위, 1998년).
그에게는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실제 기록은 썩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다.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은 1997년 한 번뿐이었다.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은 것도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였고 이후 포스트시즌 경험은 2004년 뉴욕 양키스에서 리그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진출한 것이 전부였다. 월드시리즈 통산 성적은 0승 3패 평균자책점 6.04로 별명이 무색할 정도다.
1990년대 초반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뛸 때는 로저 클레멘스, 데이비드 콘, 랜디 존슨 등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1996년부터 내셔널리그로 옮겼지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최강 투수 삼총사 그렉 매덕스, 존 스몰츠, 톰 글래빈의 벽에 막혔다. 그렇게 그는 전성기를 동시대 최고의 투수들에게 가려진 채 보내야만 했다. 그가 가질 수 있던 ‘최고’라는 이름은 ‘최고의 싱커볼러’ 정도였다.
명예와 불명예 사이
명성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브라운은 은퇴 이후 불명예스러운 이슈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7년 12월 발표된 미첼 보고서에서 약물 구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것이다. 통산 211승이라는 업적은 약물로 얼룩진 기록이 됐다. 결국 그는 2011년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탈락했고 5% 미만의 낮은 득표율(2.1%)로 피투표권마저 잃었다.
브라운은 ‘최악의 FA 계약 선수’로 자주 거론되곤 한다. 그에게 명예와 부를 가져다 준 ‘최초의 1억 달러 계약자’는 타이틀은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다.
기록 출처: MLB.com, baseball-reference
에디터=야구공작소 박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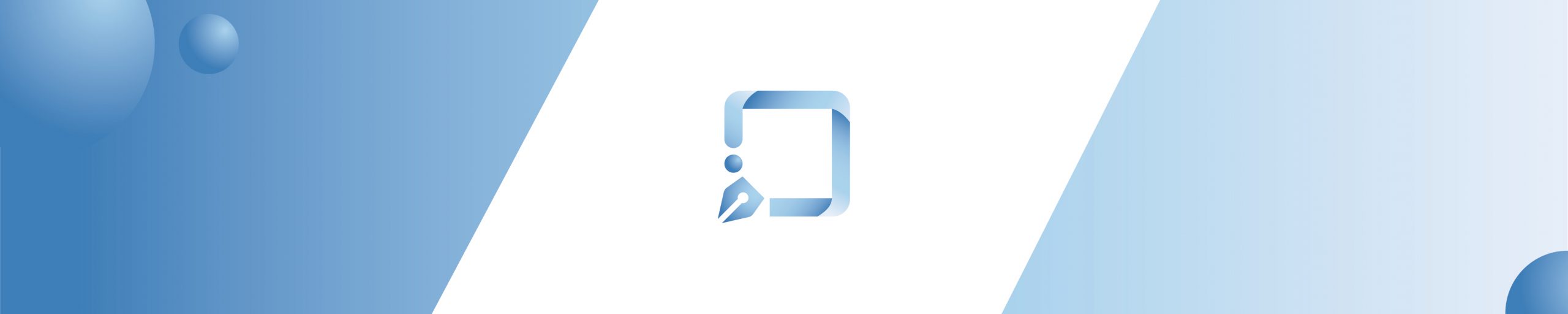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