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공작소 오연우] 지난 일요일, 롯데 자이언츠의 준플레이오프 탈락이 결정됐다. 9-0. 아쉬울 것조차 없는 완패였다. 5년 만의 가을야구는 일찍도 끝나버렸고, 다시 가을에 야구를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흔히 반은 농담으로, 반은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한다.
“롯데 말고 좀 잘하는 팀을 응원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라도 다른 팀으로 갈아타는 게 어때?”
그러나 단언컨대 나는 단 한 번도 롯데보다 야구 잘하는 팀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야구 잘하는 팀으로 갈아타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이는 롯데가 내 고향팀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약팀일수록 더욱 응원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롯데를 응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롯데가 아니어도 좋으니 나는 약팀을 응원하고 싶다.
감정의 기울기
최초의 프로야구팀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는 2년에 걸쳐 84연승을 거두고도 단 한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급격한 관중 감소를 겪어야 했다. 반면 똑같은 1승이지만 서울대 야구부가 199연패 끝에 거둔 1승은 모두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왜일까?
흔히 팀이 야구를 잘하면 팬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도 아니다.
팀 성적과 관련해서 팬이 느끼는 행복은 팀이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것 자체로 느끼는 행복과 낮은 순위에 있다가 높은 순위로 올라갈 때 느끼는 행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가 일상 속의 행복이라면 후자는 변화 속의 행복이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정말로 큰 행복, 혹은 감동은 익숙한 일상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에서 온다. 감동은 ‘감정의 기울기’이며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가 감동의 크기를 좌우한다.
야구 경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경기에서 이겼을 때 기쁜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 시작 전에 5할로 기대했던 승률이 한 경기를 거친 뒤 1로 변했기 때문이다. 0.5’씩이나’ 변했기에 기쁘다.
만약 승률이 9할인 팀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 이 팀은 이기는 게 일상이다. 그렇기에 높은 순위라는 일상에서 오는 행복은 다른 팀보다 약간 더 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팀의 승리가 주는 행복은 그리 크지 않다. 경기 시작 전에 9할로 기대했던 승률은 경기가 승리로 끝난 뒤에도 0.1 올라 1이 될 뿐이다. 감정의 기울기도, 느낄 수 있는 감동도 작다.
이는 한 시즌을 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2002년 삼성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을 때 삼성 팬들이 느낀 감동과 2014년 삼성이 4년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했을 때 삼성 팬들의 감동의 크기가 서로 같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가 2010년대에만 3번째 우승했을 때의 감동과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했을 때의 감동은 같지 않다.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약팀은 평소에 우승과 동떨어진 곳에 있어 한 번의 우승으로 큰 감정의 기울기를 느낄 수 있다. 반면 강팀은 항상 우승과 가까운 곳에 있기에 우승을 해도 감정의 기울기가 크지 않다. 우승을 해도 크게 감동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다.
감정의 축적
또한 큰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감정을 축적해야 한다. 이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패배와 실패의 역사, 인고의 시간, 이들이 만들어내는 한(恨)의 감정…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우승이라는 둑이 터져 감정이 일순간에 방출될 때 팬들은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
약팀은 둑을 터트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감정을 축적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많이 지기 때문에 감정을 쌓는 속도도 빠르고 잘 증발하지도 않는다. 반면 강팀은 감정을 쌓는 것이 어렵다. 자주 이기기 때문에 감정이 쌓이는 속도가 느리고, 감정이 쌓일 만하면 우승이라는 둑을 터트려버린다.
그렇기에 강팀의 팬들은 큰 감동을 느낄 기회가 적다. 획득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상실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목이 말라야 해갈(解渴)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영원히 목이 마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강팀을 응원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감히 강팀 팬의 마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느냐고.
맞는 말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모두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닌, 쥐가 고양이 생각해 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목마름을 예로 들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항상 목마른 사람이 한 번도 목말라본 적 없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꼴이기도 하다. 내가 두산 팬이었다면 이 글이 좀 더 설득력 있고 덜 자기합리화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약자가 강자를 연민하면 어떻게 보아도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약팀을 응원하고 싶다. 진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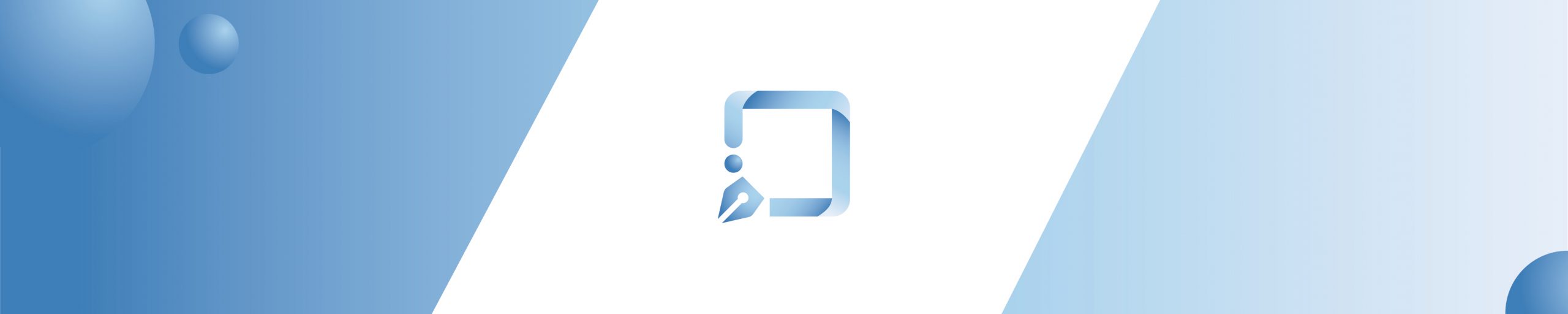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