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뉴진스 인스타그램>>
우리나라 기업은 홍보 목적으로 프로야구단을 창단했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모기업이 투자를 하면 선수단이 성적을 내고 기업은 다시 홍보 효과를 얻어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구 인기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홍보 효과가 무의미해진 지금 리그의 지속 가능성을 타개할 무언가가 필요해졌다.
최근 들어 자생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야구단을 모기업의 홍보 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일이다. 건강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의 커머스화를 염두에 두고 스포츠 구단이 생산하는 굿즈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B2B에서 B2C로
국내 프로야구단의 가장 큰 수입은 광고비다. 그중에는 모기업이 지원금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입장 수익과 중계권료는 총매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야구가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 구조를 보면 구단들이 적자 운영을 한다는 사실 뒤에 숨겨진 면이 드러난다. KBO 리그는 B2C 산업의 탈을 쓴 B2B 모델이다.
리그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B2C 사업에 대한 다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프로야구라는 엔터테인먼트가 가진 노출 효과를 넘어 커머스로의 진출을 꾀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프로야구단의 B2C 사업 모델은 이미 존재한다. 구단은 굿즈를 팔고 홈경기 이벤트를 개최하며 SNS에 게시물과 영상을 업로드한다. 이처럼 팬들에게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공급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야구단이라는 흥행 주체를 여러 플랫폼에 구전하는 OSMU(원 소스 멀티 유즈) 성격에 가까웠다. 자생력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는 순간 프로모션 하나, 영상 콘텐츠 하나에서도 투자 수익률 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부터 상품화 가치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B2B에서 B2C로, 프로모션에서 커머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야구단 굿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굿즈는 서비스의 제품화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사업 영역이다. 기존의 야구단 굿즈가 디자인이나 실용성, 품질 면에서 조악하다는 점도 기회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가 출시한 굿즈는 야구단 굿즈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남겼다.
뉴진스로부터 배우는 굿즈 디자인
지난 8월, 뉴진스는 더 현대 서울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대체로 아이돌 굿즈 제작에 있어 품질과 디자인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일단 상품을 출시하면 구매할 고객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만 넘기면 됐다. 자연스레 굿즈는 일상에서 소지하기 쉽지 않은 품질과 디자인으로 출시되곤 한다. 팬들은 콘서트장이나 팬미팅 같은 특수한 상황에만 굿즈를 착용한다. 야구단 굿즈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뉴진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한 가방>
반면 뉴진스의 굿즈는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감각 중심의 디자인이 화제가 되었다. 기존 아이돌 굿즈는 로고와 같은 상징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 왔다. 반면 뉴진스는 로고 없이 레트로 감성으로 디자인한 굿즈를 함께 선보였다. 소비자로 하여금 뉴진스 자체가 아닌 그들이 발산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브랜드 충성도의 자리를 브랜드 연상으로 채웠다. 그러자 일상에서도 뉴진스의 굿즈를 소지하는 팬들이 늘어났다(링크). 잠재적 팬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도 함께 이루어졌다.
뉴진스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추구했다. 소비자 행동론에 따르면 고객 감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예상치 못한 것(something unexpected)과 예상보다 좋은 것(more than expected)이다. 팬들은 뉴진스의 굿즈 디자인이 기존의 틀을 깰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탄생한 상품의 가치는 기대보다 훌륭했다. 일상에서 들고 다닐 만큼 범용성이 높았던 것이다. 뉴진스의 굿즈는 팬들이 지각하는 기대의 종류와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 감동으로 이어졌다.
야구단 굿즈에도 로고 혹은 마스코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상징적인 요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각적인 요소를 늘리면 폭넓은 잠재 고객층을 설정할 수 있다. 굿즈의 구매 장벽이 낮아질수록 일상적인 활용도는 증가한다. 야구장 밖에서 굿즈를 소지하는 팬들이 많아질수록 구단은 보이지 않는 마케팅 효과를 얻는다. MLB가 대표적이다.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의 팬이 아닌 사람이라도 두 팀의 로고는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메이저리그는 범용성 높은 굿즈를 개발한 것만으로 소비자 구매 여정의 첫 두 단계인 인지와 노출을 확보한 셈이다. 기업의 의도적 노출이 아닌 팬들의 자발적 노출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타석에 최대한 많이 들어서기
물론 굿즈 디자인은 어렵다. 매력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매력도는 함부로 예측하기도,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굿즈 개발 환경에서 야구단은 어떻게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을까? 유사한 생태계를 가진 게임 업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게임 산업 역시 ‘재미’라는 요소를 끌어내야 한다. 게이머들이 느끼는 재미는 제각기 다르다. 개발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와 비례한 성과가 나오지도 않는다. 몇 년간 공들여 만든 대형 MMORPG가 시장에서 실패하는 반면 기존 IP를 엮어 만든 단순한 게임이 제작비의 수십 배를 벌어들이기도 한다.
굿즈 산업과 달리 게임 업계에는 불확실성에 맞서는 분명한 전략이 있다. 언제 홈런을 칠지 모르니 타석에 더 많이 들어서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배틀 그라운드의 제작사 크래프톤이다. 크래프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종 이상의 게임을 시장에 선보였다. 중도에 제작 중단된 게임들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또한 그들은 좌우타석을 가리지 않았다. 블루홀(크래프톤의 전신)은 ‘MMORPG의 명가’라는 비전을 수정하면서까지 모바일 게임 제작사를 인수했다. 무수한 시도와 실패를 거친 끝에 배틀그라운드라는 장외 홈런이 터졌다.
야구단도 크래프톤의 전략을 참고하면 어떨까. 굿즈의 계열 확장과 범주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존에 판매하던 굿즈와 동일한 범주에서 디자인 계열을 다양화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유니폼이나 응원 도구, 생활용품 일부에 한정된 굿즈의 카테고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
주목해 볼 만한 굿즈
지금껏 프로야구단이 출시한 굿즈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KIA 타이거즈의 해태 시리즈는 계열 확장에 해당하는 예다. 타이거즈는 기존에 판매하던 휴대폰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등에 ‘해태 타이거즈’라는 신규 디자인 라인을 추가했다.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면서 크게 고민하고 사지 않는 저관여 상품 위주였다. 다만 필름 카메라와 같은 고관여 상품이 함께 판매된 것은 다소 아쉽다. 관여도가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정보 탐색량이 많은 제품이 등장하면 소비자는 구매를 포기한다. 이는 동일한 디자인 콘셉트 아래에서는 관여도가 비슷한 제품을 묶어 판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해태의 검빨 컬러와 레트로한 콘셉트를 담은 신상품은 팬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해태 시리즈(좌)와 랜더스 맥주(우)>
제닉스와 콜라보를 거쳐 출시된 게이밍 의자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껏 우리나라 야구단 중에 게이밍 의자라는 고관여 상품을 굿즈로 출시한 사례는 없었다. 충분히 범주 확장의 예시로 볼 만하다. 의자라는 단일 품목을 생산부터 홍보까지 제닉스에게 위탁한 점도 특별하다. 게이밍 의자의 대안 평가 단계에서 기능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협업이라는 카드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돋보였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2020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5개 구단이 참여했다. 기왕이면 10개 구단 모두가 협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굿즈에서 통합 마케팅이 이루어질 경우 리그와 구단의 마케팅 효과는 시너지를 얻는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SG 랜더스는 랜더스 라거, 슈퍼스타즈 에일 등을 출시하며 맥주 사업에 진출했다. 야구장 밖에서 소비되는 맥주에도 야구단의 정체성을 온전히 녹여낸 것이다. 다만 제품명과 레이블링에서 팀 컬러를 조금만 줄였다면 어땠을까. 물론 소비자가 랜더스 팬이라면 호기심에 구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랜더스 팬이 아니라면 구매할 유인이 크지 않다. 맥주 같은 저관여 상품의 경우 잠재 소비자층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카스 맥주는 동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채식주의자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다. 그렇지만 카스가 자사의 제품을 비건 맥주라고 홍보하지는 않는다.
만약 랜더스가 맥주라는 제품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하길 원했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역명을 담은 맥주로 유명한 세븐브로이와 협업해 ‘인천’이라는 맥주를 개발해서 유통하는 것이다. 이는 랜더스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 마케팅에도 어울린다. 팬들 입장에서도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잠재 소비자층은 넓어진다. 투자 수익률 달성 가능성은 올라가며, 팬들은 랜더스가 개발한 맥주라는 숨겨진 스토리(something unexpected)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낀다. 예컨대 프로 축구단 FC 서울은 수제 맥주기업 세븐브로이와 협업해 ‘서울 1983’이라는 맥주를 출시했다. 유통은 GS25와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 SSG의 이마트 같은 독자적인 유통 체인을 보유하지 않은 구단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물론 앞으로도 FA 영입을 통한 전력 강화, 시청률 상승과 기업 홍보로 이어지는 고전적인 순환구조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B2C 활동에 힘을 실어 자생력을 도모할 때도 다가왔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야구단의 대표적인 제품화 수단인 굿즈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야구단 굿즈의 중심 속성은 구단의 아이덴티티 재전유였다. 품질과 디자인을 비롯한 상품성은 주변 속성에 해당했다. 엔터테인먼트의 커머스화로 나아가는 순간 둘의 관계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뉴진스 굿즈의 사례는 디자인을 위시한 굿즈 개발 측면에서 시사점을 남겼다. 앞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한 프로야구단의 행보에 주목하면서 굿즈 산업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야구공작소 조훈희 칼럼니스트
에디터= 야구공작소 도상현, 전언수
ⓒ야구공작소.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상업적 사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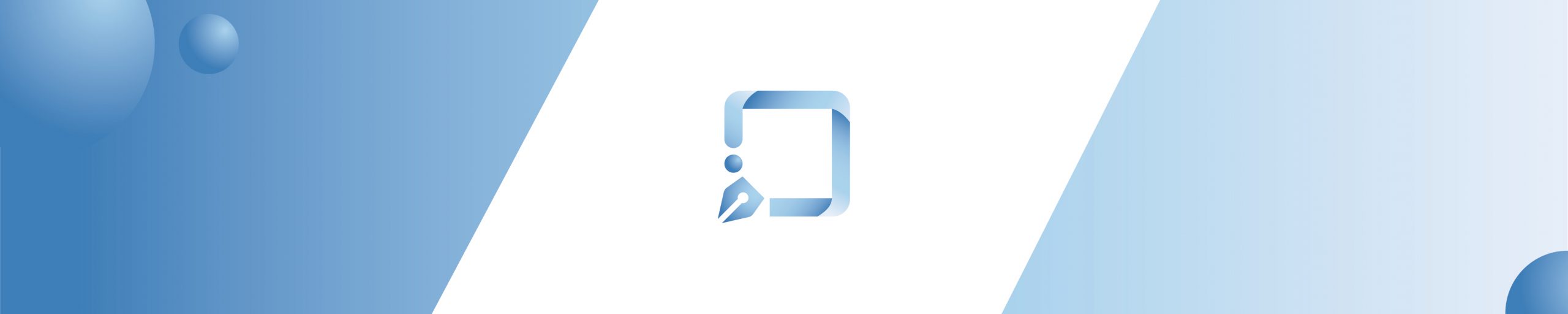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