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공작소 박기태] 메이저리그 2016 시즌의 키워드 중 하나는 ‘홈런 증가’였다. 경기당 홈런 숫자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2위에 올라섰다. 1위가 스테로이드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지난해 홈런 증가량은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를 두고 공인구 조작설까지 터져나오는 등 많은 분석가들의 이목이 ‘왜 홈런이 늘어났는가’에 쏠렸다.
해외 언론에서 일부 제기되던 공인구 조작설은 지금은 수면 아래에 묻혀있다. 접근하기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신 분석가들은 스트라이크 존 조정, 타자들의 적응을 홈런 증가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 원인, ‘타자들의 적응’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오프시즌 내내 이어졌다.
스탯캐스트의 대두
홈런 쇼가 펼쳐진 2016년 이전 10년을 돌아보면, 타자들은 투수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다. 투고타저 현상은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점수가 나지 않는 지루한 경기 양상을 해결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다.
투수들에게 ‘공격받던’ 타자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준 계기 중 하나는 스탯캐스트 시스템이었다.

<토드 프레이저의 타구 각도를 스탯캐스트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는 장면. 사진=MLB.com>
2015년 메이저리그에 도입된 스탯캐스트 시스템은 타자가 친 공과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 방향, 위치와 회전수 등을 측정한다. 이전에도 PITCH f/x 시스템을 통해 투수가 던진 공의 데이터를 얼핏 살펴볼 수 있었지만 스탯캐스트는 더욱 정밀한 자료를 제공한다. PITCH f/x 시스템이 DVD와 같은 SD 화질 영상이었다면, 스탯캐스트는 최첨단 풀HD 화질 영상에 빗댈 수 있다.
처음 스탯캐스트가 소개됐을 때 분석가들은 ‘투구 회전수’에 주목했다. 공에 회전이 더 많이 걸리면 움직임이 더욱 커진다. 이런 원리를 통해 ‘왜 저 선수의 공이 뛰어난가’에 대한 비밀을 찾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대두됐다.
하지만 투구 회전수는 선수의 개별적인 특성에 가까웠고 후천적인 개량이 쉽지 않은 면모였다. 회전수와 공의 위력 사이의 연관성도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물론 회전수가 높은 투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 회전수가 높은 커브를 던지는 콜린 맥휴가 휴스턴에 스카우팅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회전수에 주목해 더 이상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건 쉽지 않은 일로 남아있다.
대신 스탯캐스트가 처음으로 제공한 또다른 데이터, 타구 속도와 발사 각도가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홈런 증가의 비결이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기본으로 돌아가다 – 무엇이 좋은 타자를 만드는가
세이버메트리션은 선수의 생산성을 기록에 의존해 판단한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로 안타, 삼진, 출루 같은 ‘결과’ 단위 기록이다. 결과 하나하나에는 복잡한 수식과 통계적 추론을 통해 값이 매겨진다. 그러나 이런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과에 의존해 선수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가치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치 높은 타자는 더 많은 안타, 더 많은 출루, 더 많은 장타를 생산해낸다. 그러나 무엇이 더 많은 장타를 만들어내는지, 장타력이 좋은 타자와 나쁜 타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라는 결과에서 역산하기는 어려웠다. 이치로와 푸홀스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 서서히 힌트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명한 메이저리그 분석가 톰 탱고는 ‘The Book’에서 땅볼 타구와 라인드라이브 타구, 그리고 플라이볼(뜬 공) 타구의 생산력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는 플라이볼 타구와 라인드라이브 타구의 생산성이 땅볼 타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베이스볼 인포 솔루션(Baseball Info Solution)이라는 업체에서 타구의 빠르기를 기준으로 약한 타구, 중간 세기 타구, 강한 타구 비율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강한 타구일수록 생산력이 더 좋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톰 탱고의 명저 ‘The Book’. 사진=Amazon>
이를 통해 사람들은 라인드라이브와 플라이볼을 많이 만들어내는 타자, 강한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타자가 ‘더 좋은 타자’라는 식으로, ‘강한 타자’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스탯캐스트를 통해 발사 각도와 타구 속도라는 지표가 추가됐습니다. 두 기록은 톰 탱고와 베이스볼 인포 솔루션이 밝힌 실마리를 더 뚜렷하게 드러냈다.
결과는 확실했다. 생산성이 높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선 최적의 발사 각도, 최고의 타구 속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었다.
타구의 가치 정립
공개 영역에서 분석을 이어가던 톰 탱고는 지난해 MLB 사무국 산하의 공식 직원이 되어 연구를 이어갔다. 그리고 타구 속도와 발사 각도의 조합을 통해 ‘최적의 타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낸다. 그 조건을 갖춘 타구를 ‘배럴(Barrel)’ 혹은 ‘배럴드 볼(Barreled Ball)’이라고 한다.

<톰 탱고의 주도적인 연구 하에 밝혀진 ‘잘 맞은 타구’, 배럴(Barrel). 사진=MLB.com>
위 그림에서 ‘Barrel Zone’이라고 표시된 곳에 속한, 타구 속도 최소 98mph 이상이며 26~30도의 발사 각도를 갖는 타구들은 지난 2년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갖는 집합’으로 분류됐다. 해당 조건을 갖춘 타구들은 평균적으로 5할 이상의 타율과 1.500 이상의 장타율을 기록했다. 즉, 이 조건에 가까운 타구를 많이 생산해낼수록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배럴드 볼’을 많이 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뛰어난 타자는 아니다. 해당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도 안타, 2루타가 되는 타구들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 데이비스(볼티모어)는 지난해 53개의 배럴드 볼을 만들어냈지만, 51개를 만들어낸 조시 도날드슨보다 생산력에서 뒤쳐지는 타자였다. 도날드슨이 더 많은 타구, 더 많은 안타를 만들어냈고 더 좋은 출루율을 기록했기 떄문이다.
‘배럴드 볼’의 발견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 개념이 그동안 타자들을 지배해왔던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데 있다.
‘어퍼 스윙’의 중요성
타구 속도의 중요성, 즉 강한 타구의 중요성은 예전에도 타자들이 체감하고 있던 요소였다. 누구도 먹힌 타구를 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사 각도의 발견은 MLB를 지배했던 스윙, 정확히는 스윙 궤적(swing plane)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은 ‘준비자세에서 공까지 최단거리로 내리찍는 스윙’, ‘나무 장작을 쪼개듯이 공을 내리찍는(Chop Wood) 스윙’, 소위 ‘다운 스윙’을 이상적인 스윙으로 생각하고 강조해왔다. 비스듬히 공을 내려찍는 듯한 스윙을 해야 타구에 백스핀이 걸리고, 그래야만 타구가 더 멀리 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백스핀이 잘 걸린다 하더라도 타구가 땅에 내리 꽂힌다면 소용이 없다. 발사각 10도 미만의 타구는 대부분 내야수의 앞 혹은 근처에서 땅에 부딪힌다. 홈런은 절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10도 미만의 발사각을 갖고 홈런이 된 타구는 저스틴 보어의 6호 홈런 하나만 있었다. 그러나 이는 스탯캐스트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 측정된 것이다.
물론 스탯캐스트의 등장 이전에도 ‘다운 스윙은 장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다운 스윙 지도를 받은 많은 장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에 반박을 해왔다. 그러나 스탯캐스트 시스템의 출현으로 이젠 다운 스윙 궤적의 결함을 숫자로 반박할 수 있게 됐다. 다운 스윙을 한다는 장타자들은 대부분 공을 띄우는 타자들이었다. 머릿속에서 그들은 내리 찍는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배트는 공을 띄우고 있었다.

<토론토의 강타자 조쉬 도날드슨은 어퍼 스윙 예찬론을 펼치는 대표적인 선수다. 사진=조쉬 도날드슨 SNS>
이를 근거로 다운 스윙에 대비 되는 ‘어퍼 스윙’, 또는 ‘어퍼컷 스윙’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골프 스윙 같은 극단적인 궤적이 아닌 ‘살짝 올려 치는 스윙(slight uppercut swing)’을 말한다. 이미 반 세기 전,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중요성을 강조한 두 가지가 있었다. 신체의 회전력에 기반한 로테이셔널 히팅(rotational hitting)과 어퍼 스윙이었다.
저스틴 터너, 그리고 크리스 브라이언트
‘어퍼컷 스윙’ 예찬론을 실천으로 옮긴 부류가 있다. 말론 버드, 저스틴 터너는 공통의 타격 코치를 갖고 있다. 더그 래타(Doug Latta)라는 이름의 이 코치는 사실 프로 구단의 정식 코치가 아니다. 그는 고등학교 타격 코치 출신으로 LA 지역에 개설한 자신의 연습장에서 프로 선수를 비롯, 이런저런 야구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3년 말론 버드를, 2014년 저스틴 터너를 지도해 타격 각성을 이끌어낸 그의 지론은 하나. ‘공을 띄워라’는 것이다.

<저스틴 터너(우)를 지도한 더그 래타 코치. 사진=더그 래타 코치 SNS>
<팬그래프>에서는 지난해 땅볼 비율이 줄어든 타자가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이어진 글에서는 래타 코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운 스윙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찍는 스윙이라는 쓸모 없는 개념에 집착한다”는 것이었다.
내셔널리그 MVP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경우는 조금 다른 사례다. 데뷔 첫해 신인왕에 오른 그와 컵스 구단의 고민은, 홈런 타자인 그에게 헛스윙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다. 홈런 타자인 브라이언트의 타구 각도는 이미 리그 최정상 급으로 높았다. 구단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타격 분석 회사는 머리를 맞댄 끝에 ‘적당한 수준으로 스윙 궤적을 낮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브라이언트는 1년 전보다 많은 홈런을 쳐내는 동시에 더 정교한 타격을 하는 데 성공했다. 터너가 땅볼을 치던 타자에서 라인드라이브와 플라이볼을 친 타자가 됐다면, 브라이언트는 ‘지나치게 공을 띄우던 타자’에서 ‘적당히 공을 띄우는 타자’가 된 경우다. 그러나 둘 다 15~20도 사이의 평균 타구 발사 각도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작점은 달랐지만 지향하는 지점은 같았던 셈이다.
낮은 공에는 퍼올리는 스윙, 퍼올리는 스윙엔 높은 공
J.D. 마르티네즈 역시 스윙 궤적 조정의 수혜자다. 평범한 타자였던 그는 투수에게 라인드라이브로 공을 돌려보내는 스윙이 가장 뛰어난 스윙이라고 믿고 있었다. 휴스턴에 있던 2013년,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그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중이던 동료 제이슨 카스트로의 스윙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러던 중 그는 눈이 번쩍 뜨이는 발견을 했다. 카스트로의 스윙을 보던 중이 아니라 케이블뉴스에서 나오는 라이언 브런의 스윙을 봤을 때였다. 순간 그의 눈에 브런의 스윙과 카스트로의 스윙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2013년까지 OPS 0.687을 치던 마르티네즈는 2014년 0.912의 OPS를 기록하며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됐다.
투수들이 그를 상대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2013년 투수들은 그에게 패스트볼을 낮게 던졌지만, 2016년에는 상대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투수들이 그에게 높은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다.

<2013년 낮은 공을 많이 상대하던 J.D. 마르티네즈는 지난해 높은 공을 더 많이 상대했다. 사진=팬그래프>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명백하다. 공을 퍼올리는 법을 알게 된 그에게 낮은 공을 던지는 게 이제는 예전만큼 좋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단 마르티네즈만이 아니다. <팬그래프>에 따르면 땅볼 타구의 비중이 5% 이상 줄어든 타자의 수가 지난해 최근 7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스틴 터너, 크리스 브라이언트, J.D. 마르티네즈처럼 플라이볼을 만들어내는 타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에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존의 높은 곳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
어퍼컷 스윙의 조명은 야구의 진화 과정
이는 큰 맥락에서 보면 투수와 타자가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06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MLB를 생각해보면, 투수들은 어느 순간부터 투심 패스트볼과 커터 장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더 많은 땅볼을 만들어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점점 더 낮아지는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톰 탱고는 투심과 싱커에 어퍼컷 스윙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의 말처럼 투심과 싱커가 대유행을 타게 되자 이에 반격하듯이 땅볼이 아닌 라인드라이브와 플라이볼을 지향하는 타격 철학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향점은 점점 늘어나는 수비 시프트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물론 어퍼컷 스윙, 많은 플라이볼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 플라이볼 비율(FB%)과 OPS의 상관관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J.D. 마르티네즈보다 FB%가 높은 맥스 케플러는 그보다 더 낮은 타격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 고든이 공을 띄운다고 해서 더 많은 홈런을 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야구에서도 옳지 않은 방법이다. 플라이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전까지 하나의 정답이 있던 것으로 여겨졌던 스윙 궤적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선이 비춰지고 있다. 이제는 현장 코칭스태프에서도 이런 흐름을 인정, 아니 장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츠버그의 클린트 허들 감독은 타자들에게 ‘OPS는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Your OPS is in the air)’고 말했다. 땅볼만 쳐서는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적응과 진화를 반복하는 생태계처럼, 야구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 참조
Can more MLB hitters get off the ground?, Travis Sawchick, Fangraphs, 2017-02-07
MLB hitters are getting off the ground, Jeff Sullivan, Fangraphs, 2017-02-14
Hurdle To Bucs’ bats: ‘Your OPS is in the air’, Adam Berry, MLB.com, 2017-03-01
Has the fly-ball revolution begun?, Travis Sawchick, Fangraphs, 2017-03-02
J.D. Martinez debunks conventional wisdom, thinks a tipping point is near, Travis Sawchick, Fangraphs, 2017-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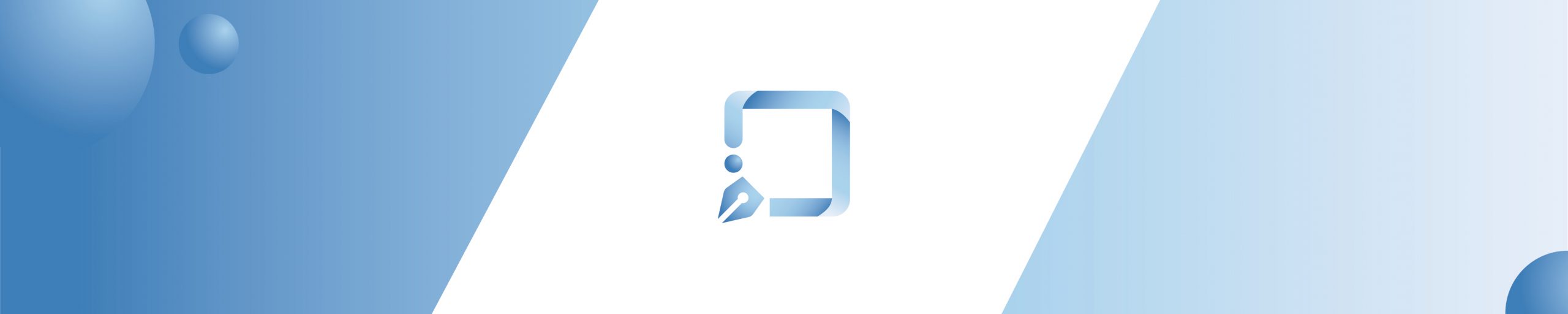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