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두산베어스 페이스북 >
‘느림의 미학’ 유희관 투수는 지난 18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프로 주전급 투수라고는 믿기 어려운 120km/h대 직구를 가지고 101승의 대기록을 남기며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를 상대하여야 했던 팀의 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선수, 그리고 전력분석에게도 그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선수들은 언제나 그가 던지는 바깥쪽 체인지업을 어려워했고 전력분석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하루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유희관의 특성을 역이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유희관은 심판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투수다. 언제나 말도 안 되는 볼을 던지고 아쉬워하며 심판을 헷갈리게 한다. 오늘은 반대로 이용해보자. 만약 걸치는 공이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어라.”
선수들이 잘 들어줄까 걱정하였지만 선수들은 1회부터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아쉬운 듯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의 존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4회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는 김태형 감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날 경기는 패배하였지만 가장 전력분석답지 않은 전략으로 선발투수 공략에 성공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남아있습니다.

통계쟁이로서 유희관은 좋아하기 힘든 투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독 넓게 잡히는 스트라이크 존이 싫었고, 유희관을 예로 들며 구속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유희관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100승을 거두는 동안 언제나 논란이 되었던 ‘희관존’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살짝 벗어나는 공이 들어올 때마다 충분히 아쉬움이 전달되면서도 심판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미묘한 경계의 행동을 취했고, 이는 심판이 흔들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곳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제구력까지 갖추면서 ‘희관존’은 무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통계가 야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그는 어쩌면 야구는 사람이 하는 스포츠라는 것을 가장 잘 이용한 선수가 아니었을까요? 비록 이제 마운드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마이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야구공작소 익명의 구단 관계자
에디터 = 야구공작소 홍기훈
ⓒ야구공작소.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상업적 사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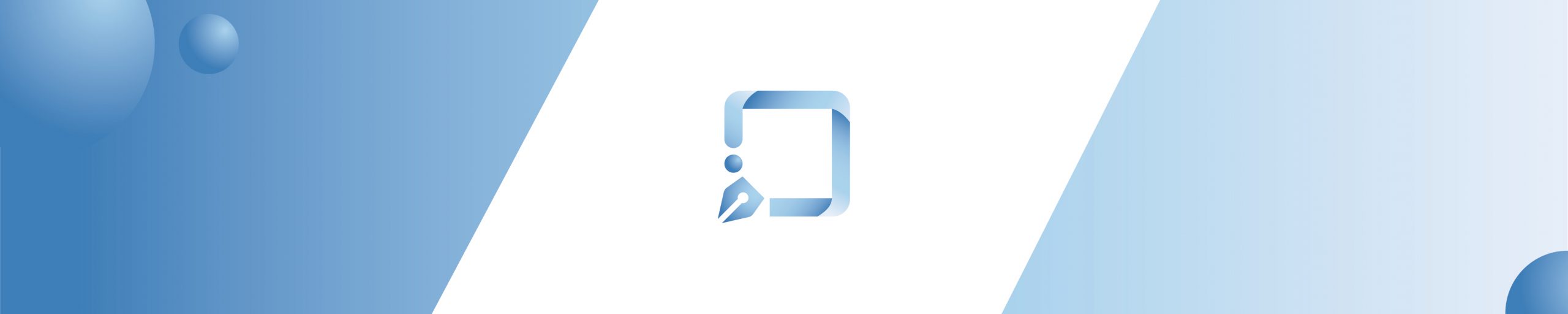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유독 넓게 잡히는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쓰셨는데 “‘희관존’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 쓰신 연기력과 제구력 덕분이라는 뜻일까요?
그러게요 운이 아니었다. 사실은 연기였다 라는 것 외로는 해석되지 않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