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연재물은 ‘KBO 박스스코어 프로젝트’와 함께 합니다.
2021년 4월 KBO 리그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야수의 마운드 등판’이었다. 4월 10일 대전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한화 이글스전에서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이 내야수 강경학과 외야수 정진호를 마운드에 올렸다. 이에 대한 한 해설위원의 날 선 비판이 겹치며 ‘투웨이 아닌 투웨이’는 화제가 됐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며 수베로 감독의 작전을 옹호했던 허문회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아예 17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27개의 아웃카운트 중 야수에게 8개를 맡기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경기 포기’라는 논란이 일자 허문회 감독은 “승리조를 아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허문회 감독은 22일 경기에서도 포수 강태율에게 수비에서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책임지게 했고, 5월 1일 한화전에도 내야수 김민수와 배성근을 마운드에 올렸다.
롯데의 이 같은 시도는 1980년대 프로야구를 소환하게 만들었다. 강태율은 1982년 김성한(해태) 이후 처음으로 등판 다음 날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 김민수는 전업 야수가 탈삼진을 기록한 최초의 사례로 등극했다. 또한 17일 경기에서 3명의 야수가 마운드에 오른 것은 1985년 MBC 청룡의 2명(김정수-안언학)을 뛰어넘는 신기록이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투수였던 오윤석은 9회 말 안타를 때려내며 투수 포지션에서 안타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

투수의 안타,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롯데 역사에서 처음 나온 장면은 아니었다. 시계를 37년 전으로 돌려 1984년 8월 16일로 가보자. 부산 구덕야구장에서는 롯데와 MBC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롯데는 좌완 이진우를, MBC는 우완 에이스 하기룡을 선발투수로 내세웠다. 그러나 롯데는 전가의 보도가 ‘원 플러스 원’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바로 후반기부터 구원투수로 전업한 ‘에이스’ 최동원이 언제든지 출격을 준비하던 것이었다.
3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한 이진우가 4회 초 1사 후 김재박에게 볼넷을 내주자 강병철 롯데 감독이 움직였다. 드디어 최동원이 올라온 것이다.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마운드에 오른 최동원은 그러나 4번 이광은에게 안타를 맞으며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내더니 김인식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다. 소방수 최동원의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롯데 타선도 가만히 에이스의 실점을 두고 보지는 않았다. 4회 말 홍문종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롯데는 8회 말 바뀐 투수 유종겸을 상대로 4번 타자 앞에 1사 만루라는 밥상을 차렸다. 절호의 역전 찬스를 해결하기 위해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는 바로… 투수 최동원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시점을 6회 말로 돌려보자. 이날 롯데의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선수는 당시 타율 4위에 올라있던 강타자 김용철이었다. 그러나 6회 말 타석에서 김용철이 자신의 타구에 눈을 맞으며 대타 김한조로 교체됐다. 돌아온 7회 초 수비에서 롯데는 지명타자 김민호를 1루수로 내세웠다. ‘지명타자가 야수로 나서게 되면 투수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야구규칙에 의해 당시 마운드에 있던 최동원이 4번 타자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번 김용희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던 순간, 최동원은 유쾌한 반란을 만들어 낸다. 최동원은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유종겸의 4구째를 공략,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터트리며 2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4회 ‘분식회계’로 들여보낸 한 점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준 셈이다.
9회 초 MBC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최동원은 승리를 챙겼다. 최동원은 1982년 해태 김성한(2회)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결승타점을 만든 선수가 됐다. 이후로 봐도 이듬해 김재박(MBC)을 제외하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진기록이었다.
이날 승리로 최동원은 시즌 19승째를 기록하게 됐다. 전반기를 9승으로 마감한 최동원은 후기리그가 시작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10승을 챙겼다. “우리도 우승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박종환 롯데 전무의 말에 동의해 구원투수로 전업한 최동원은 팀 승리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것도 모자라 아예 타석에서도 팀을 ‘하드캐리’했다.
또한 이날 승리로 롯데는 8월 11일부터 이어진 연승 숫자를 ‘5’까지 늘렸다. 15일 경기에서 승리하며 1982시즌 초반 잠시 선두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국가대표 라인업에 에이스까지 가세했음에도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했던 롯데는 드디어 감동의 드라마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는, “마, 함 해보입시더”였다.
에필로그 – 1984시즌 27승 13패 6세이브 평균자책 2.40의 성적을 거두며 리그를 제패한 최동원은 골든글러브와 베스트 10이 통합된 첫해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시상자로 나선 배우 김혜자는 “올해 2루타를 쳐서 득점을 올리셨는데 혹시 타자로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동원은 “아니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쑥스러운 웃음을 지은 최동원은 “상대편에서 저를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라며 겸손함을 표시했다.

야구공작소 양철종 칼럼니스트
ⓒ야구공작소.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상업적 사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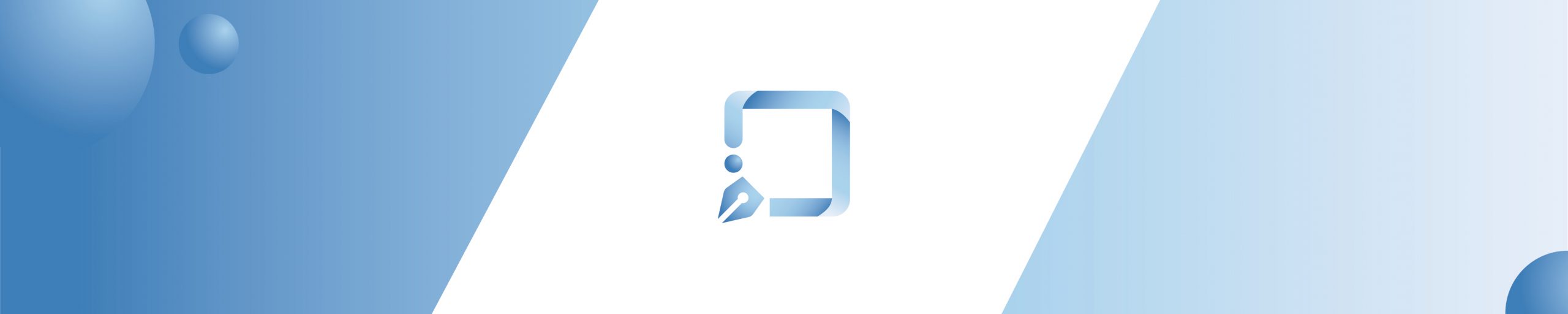
댓글 남기기